|
과거매매(科擧賣買) 조선 말기에 안동 김씨들이 온갖 세도로 치부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로 치는 것이 매관매직이었다. 매관매직의 일화 중에서는 어느 돈 많은 양반이 김문(金門)에 돈 5만냥을 바치고 고을사또를 사서 부임하려다가 마침 지독한 고뿔이 들어 한 댓새쯤 자리지고 누웠다가 견마 잡혀 임지로 갔더니 이미 10만냥 준 새 사또가 동헌을 차지하고 있어 돈만 날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매관매직이 이 정도니 과거시험이란 것도 다를 바 없었다.원래 중국문화권에서는 과거를 통한 관리 선발이 상례화되었고 우리도 고려때부터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세도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할 때는 이 과거제는 그 뿌리부터 흔들린다. 권력이란 놈은 잡은 쪽에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자는 괴물같은 존재라서 권력으로의 등용문인 과거는 자연히 그들 손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고려때의 12공도나 조선시대 사림의 사승(師承)관계의 엄격함이 빚어낸 당파같은 것은 폐쇄적이긴 해도 나름대로 학문적 기반과 정치적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조선시대 영조대 이후 노론의 일당독재가 한 100년을 넘으면서는 과거란 게 개인적 역량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의 소유여부를 묻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과거 자체에 대한 존폐여부를 묻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많이 나왔고 개혁론자라면 입을 모아 과폐(科弊)의 개혁을 첫 번 째 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렇지만 노론 벌열 가문이 치부의 수단과 권력 세습화의 수단으로 전락한 이 제도를 바꿀 리는 없었고 1894년 갑오년의 개혁에 가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제도 자체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했던 순조, 헌종 때의 세도가문은 통과(統科)라는 과거를 만들어 자기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뽑았다. 여기는 아예 실력도 필요 없고 순번에 따라 뽑아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었다. 이들이 철종, 고종때의 재상 자리에 앉았으니 정치가 어떨지는 뻔했고 이들이 또 답안지를 심사하는 시관(試官)이 되었으니 그 실력도 문제였다.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말로는 종종 영의정을 지낸 대원군의 형 이최응과 심순택이 시관에 임명되는 데 이들은 어(魚)자와 노(魯)자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라 무식한 사람들이 경사가 났다고 좋아했다고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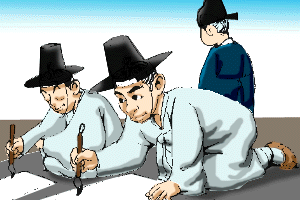 과거장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다. 원래 과거장에 들어오는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흘첩(照訖帖)이라는 허가장을 받아 과거날 갓끈에 달고 들어 오는데 한 사람에 하나만 가능했다. 그런데 대리시험을 치자면 하나로는 부족했다. 대리시험에서 글을 지어주는 사람을 거벽(巨擘)이라하고 대리로 써주는 사람을 사수(寫手)라고 했다. 부유한 집 양반이 평소에 글줄이라고는 구경도 하지 않다가 과거 날 즈음해서 대리시험 칠 사람을 구하는데 성균관의 유생들이 주로 이를 맡았다. 거벽과 사수를 같이 시험장에 넣으려면 첩을 가진 가난한 선비에게서 첩 한자리를 살 수 밖에 없었다. 이 조흘첩 제도도 고종연간에 없어지고 아무나 들어가도 막지를 못했다. 그래서 응제령(應製令)이 내리면 물장수, 나무장수, 똥장군도 유건(儒巾)을 쓰느라고 법석을 떨었고 엄숙해야 할 과거장이 저자거리처럼 시끄러워 사탕이나 술을 팔기도 하고, 답안을 안 보여준다고 싸움질하는 욕설까지 오가는 형편이었다. 또 멍청하니 하늘만 보거나 붓방아만 찧어대는 이들에게 뭐하냐고 물으면 “외장(外場)이요” 라고 대답하기 일쑤였다. 외장은 과거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 답안을 써서 나중에 바치는 것이었다. 이러니 아무리 공정한 시관이라 해도 제대로 된 인재를 뽑을 수 없었고, 뽑아 놓고 나면 전부가 부귀한 가문의 자제들뿐이었다. 고종이 돈 좋아한다는 말은 이미 당시에도 소문난 이야기이지만 지방관 임명에 뇌물을 받는 것은 종친이나 처가, 사돈 할 것 없이 모두 예외가 아니었는데 갑오개혁 이후 지방관제를 개혁하면서는 더욱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관찰사는 10-20만 냥, 일등 수령은 5만냥 이상을 받았고, 벼슬자리에 눈먼 자들이 보따리로 돈을 싸서 줄을 섰다. 1905년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에 항의해 자결한 민영환의 장인은 서상욱이었다. 민씨 척족으로 왕이나 왕비의 총애를 받던 민영환은 오랫동안 왕에게 장인을 위해 고을 원 자리를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종이 “네 장인이 아직 고을자리 하나가 없더냐?”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내가 깜박 잊고 있었구나. 광양군수 자리를 주도록 하마.” 했다. 민영환이 집에 돌아와 기쁜 얼굴로 “오늘 임금께서 장인에게 고을 자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천은이 감읍할 뿐입니다.” 하고 어머니께 아뢰었다. 어머니가 빙긋 웃으며 하는 말. “넌 정말 둔한 바보 척족에 불과하구나. 너한테 후하게 대한 것이 네가 인척이라서겠느냐? 내가 이미 5만 냥을 갖다 바쳤다.” 과거도 돈으로 해결되었다. 의주 부윤을 하던 남정익은 10만 냥을 갖다 바치고 아들 남규희를 장원을 시켰고, 박영효가 이 문제로 고종에게 따지자 고종은 묵묵부답이었다. 과거나 관직을 돈으로 산 벼슬아치가 투자한 이상으로 백성에게서 빼앗을 것은 당연했고 이를 나라의 최고 어른노릇을 하던 왕이 앞장섰으니 농민전쟁과 같은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고 나아가 일본에 나라가 먹히기까지 했던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관직을 매매하는 행위가 신문지상에 큼직하게 보도되는 요즘 세상도 100년이 훨씬 넘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더구나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당연히 그 학생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입시의 점수가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더 얻으려는 그 학생들의 욕망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른들이 어떻게 학생들만 정직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사회의 거울일 뿐이다. |
- BoardLang.text_prev_post
- [역사산책] 경상도 보리문둥이(?)
- 2004.06.14
- BoardLang.text_next_post
- [역사산책] 다리의 애환
- 2004.12.31
